[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에 힘을 쏟고 있다.
MVNO는 SK텔레콤, KT 등 기간 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고객을 직접 유치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기간 통신사에 낸다. 기간 통신사 입장에서는 `B2B(기업간 거래)` 사업인 셈이다.
최근
KT(030200)는 CJ 같은 대기업은 물론 온세텔레콤 전국망 사업자까지 적극 MVNO로 끌어들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내년 1월, 온세텔레콤은 3월에 이통재판매 사업에 들어간다. KT는 또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프리텔레콤 등의 중소 통신사업자와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동통신 1위 업체로 MVNO 의무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SK텔레콤과 대조되는 행보다. SK텔레콤은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아이즈비전 등 2~3곳과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MVNO의 서비스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적으로 이통통신 재판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KT가 의무사업자보다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2위 업체로서 실보다 득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재판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기간 통신사의 고객은 감소하지만 KT는 2위이기 때문에 SK텔레콤보다 잃을 것이 적다"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으로 공고한 상황에서 마케팅비를 쏟으며 점유율을 올리기보다 MVNO를 통해 우회 돌파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도 이동통신 재판매 초기에는 2, 3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MVNO 유치에 열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부터 MVNO가 시작된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1위 사업자 버라이즌보다 후발업자인 AT&T 등이 더 적극적이었다.
CJ나 온세텔레콤이 내년 값싼 상품으로 고객을 많이 끌어 모은다면 KT는 간접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자사 고객을 잃을 수 있지만 망 이용대금을 받아 상쇄할 수 있고, SK텔레콤에서 MVNO로 빠져나가는 만큼 점유율 확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간통신사가 `갑`의 위치다 보니 MVNO의 요금 설계에도 입김을 넣을 수 있다"면서 "특히 CJ의 경우 CJ의 막강한 콘텐츠와 각종 마케팅 제휴 등 KT 입장에서는 얻을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이동통신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도 관련 부서를 두고 이 사업 진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스마트폰에 `장동건`을 말하면 영화 `친구`가 뜬다☞상상주식회사 최고사원은 `소수정예`☞KT, X-마스 맞아 무료게임·공연티켓 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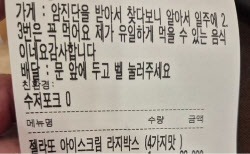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강 건너고 짐도 나르고…‘다재다능’ 이상이의 무한변신 차는[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3000131h.jpg)

![선도지구 탈락 지역, 행정소송 가능할까?[똑똑한 부동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3000125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