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정점을 지났다면 다음달 17일 삼성물산의 합병결의 임시주총에서 결판이 날 엘리엇사태는 지금이 ‘잠복기’인 셈이다.
강경파 행동주의 펀드로 악명(?) 높은 엘리엇은 운용규모만 우리 돈으로 140조원에 달하는 ‘큰 손’인 데다 이미 채무 위기를 겪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페루 국채를 사들여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을 챙길 정도로 ‘전력(前歷)’이 화려하다.
그 전력에 걸맞게 엘리엇 등장의 파장은 만만찮다. 평소 움직임이 무겁기만 한 삼성물산 주가는 엘리엇의 커밍아웃 이후 하루에 10%가까이 움직이는 날들이 속출할 정도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 18일 개설한 엘리엇 홈페이지를 훑어 보면 ‘합병 반대’가 괜한 공갈포가 아니라 작심하고 달려 들었다는 게 느껴진다.
장부가로 따져서 삼성물산의 가치 7조8000억원을 넘겨준 꼴이라는 자극적인 공세와 함께 ‘삼성물산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됐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의문이라는 모간스탠리, 크레딧스위스, 메릴린치 등의 평가까지 곁들였다.
최근 만난 기관투자가도 “국익을 생각하면 당연히 삼성 편이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자면 엘리엇의 주장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엘리엇 사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공산이 크다.
재계에서는 해외투기자본의 무차별 공세를 막기 위한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며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같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일리있는 말이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모든 역량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걸핏하며 딴지를 거는 투기세력에 대응하느라 헛심을 쓰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도 유익하지 않다.
최근 사례로는 현대차그룹의 강남 삼성동 부지 매입건이 대표적이다. 사실 이 결정을 납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극소수라는 게 정설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판이었다는 쓴소리도 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현대차 주가는 이후 속절없이 고꾸라져 지금은 13만원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SK그룹의 소버린 사태나 KT&G를 흔들었던 칼 아이칸 공세도 비슷한 약점을 파고 들었다. 나머지 주주에 대한 배려나 교감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경영권을 자신할 만큼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적대적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글로벌화된 자본시장에서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에 호소할 시기는 지났다. 국민연금만 해도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합병무산에 기여한 데 이어 SK와 SKC&C의 합병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만큼 철저히 ‘이익’ 중심으로 움직인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내 시장이 글로벌 사냥꾼의 놀이터가 돼서도 안되겠지만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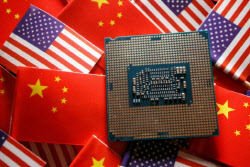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매그7' 일제히 상승…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300132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