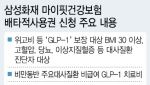[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강화는 자국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간 벌기다.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사진)는 지난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등록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규범조건 등록제’ 등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다.
중국정부의 규제 강화는 자국 배터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SDI와 LG화학 같이 중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에 이러한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규제는 작년 12월 중국산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가 홍콩에서 화재 사고를 낸 후 중국 정부는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올해 1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삼원계 방식 배터리 탑재 전기버스를 제외했다. 특히 자국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LFP(리튬인산철) 방식 배터리 탑재 전기버스에는 보조금을 계속 주면서 보호주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교수는 “미국 앨리바마 공장에서 만든 쏘나타가 미국산인것 처럼 중국 현지에서 만든 배터리는 중국산“이라면서 ”중국의 고용창출 등 기여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문제를 삼으면 과연 누가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SDI와 LG화학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지만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 1월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한중통상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필수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자국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칼자루를 휘두른다면 결국 중국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고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중국의 규제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등 중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차별 역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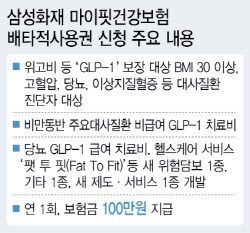





![[포토]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908t.jpg)
![[포토]따스한 온기를 퍼지는 행복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829t.jpg)
![[포토]이웃을 위한 연탄나눔봉사활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804t.jpg)
![[포토]한동훈,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792t.jpg)
![[포토]설영희부띠끄 24W/25S 살롱 패션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633t.jpg)
![[포토]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공식 출마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064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465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359t.jpg)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