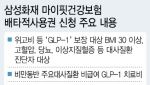[이재영 경남대 정외과 교수] 7월 3~4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중 양국간 의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방한이 지난 5월 2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문 때 약속된 만큼 상당한 준비가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보유 반대’와 같은 진부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 부족과 여기서 비롯되는 빗나간 전략의 가능성 때문이다. 중국의 미국 설득능력, 그리고 북한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철저한 정상회담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중국의 미국 설득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미국은 제1차 핵위기에서 북한 핵과 경제적 지원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1999년 3·16 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냈다. 역시 제2차 핵위기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2007년 10·3 추가조치를 이끌어 냈다. 미국의 불만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북한의 변화를 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이 먼저 북한에 접근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여기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안보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고, 이를 북한에 전달해 6자회담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이해이다. 북한과 일본은 납북자 재조사에 돌입했다. 대신 북한은 일본의 단독제재 해제, 국교정상화, 인도적 지원 등의 이익을 얻게 됐다. 이는 북·일간 단순한 거래일 수 있다. 거래 플러스 알파(+α), 즉 단순거래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미·일의 전략이 더해졌을 수도 있다. 어쨌든 여기에는 중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현 북·일관계를 중국 배제가 아니라 북한과 일본의 이익추구로 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이 북한을 배신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중·일관계 악화는 물론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열정도 식어버릴 것이다.
경계해야 할 점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지난 4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건 사건을 실례로 들 수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설득 노력을 해 주고 …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무리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요청을 받고 북한의 내정을 간섭할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결과에 따른 비정상적 국가관계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부탁을 했을 때, 결과에 관계없이 중국에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이 ‘갑과 을’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당당하게 대중외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중국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중국도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과거사를 부정에 맞서는데 한국의 지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립과 시안 광복군 표지석 제막식 등을 수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리고 201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6.1%로 1위이지만, 중국의 대한국 무역의존도 역시 7%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국 우위품목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더 이상 혈맹인 북한의 적국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이익에 필요한 핵심적 존재로 변했다는 의미이다.
6자회담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속적 대립은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한반도 전쟁이라는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북·미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6자회담 재개에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러시아 복귀, 대북 전제조건 완화, 한·일관계의 개선은 미국의 역할이다. 북·미관계 개선 및 북한과 일본의 밀착관계의 이해는 중국의 역할이다. 일단 한·중 정상회담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중국을 움직여 전제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중국 의존도가 과도하면 정치·경제적 종속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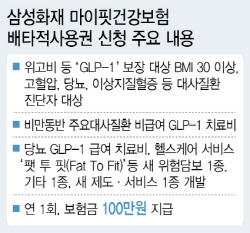





![[포토]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908t.jpg)
![[포토]따스한 온기를 퍼지는 행복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829t.jpg)
![[포토]이웃을 위한 연탄나눔봉사활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804t.jpg)
![[포토]한동훈,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792t.jpg)
![[포토]설영희부띠끄 24W/25S 살롱 패션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633t.jpg)
![[포토]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공식 출마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064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465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359t.jpg)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