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내용은 대단히 복잡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이번 면세점 2차 선정은 1차 때보다 오히려 더 얽혀 있어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 그만큼 정부도 골머리를 앓을 듯 하고.
물론 관세청이 내놓은 심사평가기준뿐이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관리역량(300점)과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이 총 1000점 중 550점이나 차지한다. 이 두 가지가 높은 배점이란 건 결국 어느 업체든 전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살려낼 수 있을 건가가 평가의 핵심이란 뜻이다. 하지만 1차 때와는 달리 정치권과 정부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다면 판세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일단 정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문제, 특혜의혹 등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르자 ‘말 많은’ 면세점 사업자 특허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면 위로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 일각은 롯데의 경영권 분쟁 이후 일본기업이 국내 면세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반(反)재벌정서 확산을 의식하고 독과점 규제나 특허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업이 사업권을 따든 뒷말이 생길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 가까운 일본을 한번 보자. 일본정부는 지난해부터 내수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했다. 면세적용 금액을 8%로 확대하고 외국인 면세 대상품목도 식품·음료·약품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시내 면세점수도 대폭 늘렸다. 결과는 어땠을까. 최근 일본관광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에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쇼핑액은 1조 9억엔(약 9조 59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8%가 늘어났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별로 사활이 걸린 쇼핑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면세점 사업에 얼마나 아낌없는 지원을 하느냐는 것. 일본과 중국에서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은 이유는 하나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세계의 면세사업자와 대결해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어떤가.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융통성 없는 정책 한 가지로 면세업체의 발목을 잡아왔다.
1962년 국내 면세점의 효시라 할 김포공항 면세점이 문을 연 지 53년이 흘렀다. 이제 면세사업은 글로벌시장에서 가장 격렬하게 경쟁하는 수출산업이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관광산업진흥책을 낮춰 볼 생각은 없다. 다만 지금부턴 방법을 바꿔야 한다. 면세사업을 챙기지 않고 관광산업활성화를 해보겠다는 건 이젠 어불성설이다. 국내 면세사업이 사방에서 옭아맨 규제 탓에 그저 그런 내수산업에 머물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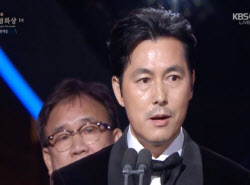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강 건너고 짐도 나르고…‘다재다능’ 이상이의 무한변신 차는[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3000161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