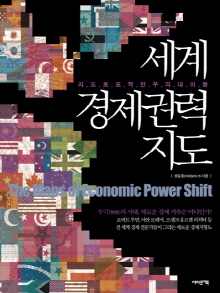 | | ▲ `세계 경제권력 지도`(어바웃어북) |
|
[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1999년 미국 달러의 독주를 잠재우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하나 된 유럽`의 상징, 유로존이 그 주체였다. 그들의 화폐인 유로화엔 장밋빛 희망을 새겼다. 그후 10여년, 숙원하던 미국의 독주를 드디어 잠재운 듯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호기롭던 유럽도 같이 저물게 된 거다. 독주 또 그 견제 세력까지 막아선 건 중국을 앞세운 신흥국들이다. 그 제3의 세력이 미국과 몇몇 국가들로 깔끔하게 구획됐던 경제지도를 복잡하게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지구촌 경제를 돌리던 축이 옮겨가고 있다는 말이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의 지형이 뒤바뀌고 있다. 한마디로 `선진국 추락 신흥국 부상`이다. 국내외 경제·정치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4명의 현직기자들이 이 추세를 따라잡았다. 하나뿐이던 `태양` 미국이 저물며 격렬하게 벌어지는 왕권 다툼, 칼 같던 경제질서가 어그러지며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들, G7에서 G20으로 확대된 글로벌 지배구조의 새판 짜기 등 어지러운 정세를 세세하게 짚어냈다(`세계 경제권력 지도` | 송길호·김춘동·권소현·양미영|392쪽|어바웃어북).
가장 큰 관심은 `새로운 축`이다. 달러·유로화의 추락으로 앵글로색슨 자본주의가 정말 붕괴할까. 그러나 우려가 현실인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신흥국에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선진국이 생떼를 쓰는 일, 중동의 한 실직 청년의 죽음까지도 결국 미국을 때리게 되더라는 거다. 연관성이 희박한 요소들조차 미국 자본주의에 구멍을 내는 나비효과란 얘기다. 발단은 미국 발 금융위기지만 파급력은 도미노급이었다.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 등의 재정위기는 유럽 전체를 흔들고 있다. 당장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어떻게 불어갈 것인가도 관건이다. `아랍의 봄`은 유럽을 거치면서 `미국의 가을`로 이어졌다. 서쪽으로 전진하던 항거물결은 뉴욕서 정점을 찍으며 탐욕스런 1%에 대한 99%의 분노가 됐다.
 | | ▲ 국제통화시스템의 변천사 (사진=`세계 경제권력 지도` 58~59 페이지 발췌) |
|
그 사이 형세는 신흥국으로 기울었다. 중국·인도·브라질·칠레 등 신흥국들은 무엇보다 경제위기 탈출에서 극명한 속도차이를 냈다. 2009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3.5%, 유로존이 -4.3%, 일본이 -6.3%로 추락하는 사이 중국은 9.2%, 인도는 6.8% 성장했다. 브라질조차 -0.6%에 그쳤다. 그렇다면 혼돈의 경제판을 평정할 왕좌가 이들 신흥국에서 나올 것인가.
강력한 후보는 역시 중국이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는 권력이동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은행으로 교차되는 산업 변화에서도 중국은 핵이다. 2011년 현재 중국의 공상은행은 시가총액은 물론 영업이익에서도 세계 1위를 꿰찼다.
물론 중국 대세론에 부정적 시각이 없는 건 아니다. 미래학자 리처드 왓슨은 “중국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세계 대권을 노려보기도 전에 성장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저축률도 높고 실업률도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시대의 질곡인 `사라지는 젊은층 일자리`가 결정적 위험인자란 거다. 더 나아가 `일극`의 구심점이 없어진 세계가 다극을 넘어 무극의 G0시대가 될 거라 점치는 이들도 있다.
`불확실성`만이 확실한 세상으로 가는 길에 맞닥뜨린 사안들이 총망라됐다. 그 논점에 붙인 150여개 그래픽과 일러스트가 빠른 이해를 돕는다. 책의 미덕은 첨예한 이슈들을 줄줄이 꿰어내 돌아가는 판도가 한눈에 들어오게 만든 데 있다. 시사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든 전문 경제지식이 필요하든 아니면 저자들의 의도대로 경제권력이 이동하는 좌표값을 구할 매핑을 하든 부족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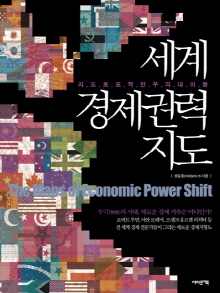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강 건너고 짐도 나르고…‘다재다능’ 이상이의 무한변신 차는[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3000161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