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상관이 없을 법한 시선이지만 공직사회에서 수입차를 대하는 자세는 유독 경직돼 있다. 수입차가 대중화하면서 ‘공무원 차는 국산차’라는 인식도 바뀌는 추세이지만, ‘수입차 타는 공무원’은 여전히 민원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
과거와 비교하면 공직사회에서 수입차를 대하는 자세가 유연해졌다는 게 관가의 설명이다. 공무원 차량은 ‘2000cc 이하 국산차’가 정도가 기준으로 통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고위 공직자가 수입차를 리스 차량으로 이용함으로써 재산 신고를 피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니 고위 공무원 이하 공직자가 수입차를 타려면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게 분위기였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2000년대 공직 생활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 수입차를 타는 공직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시대상이 청렴과 검소함이었기에 그러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다섯에 하나가 수입차일 정도로 대중화하면서 공직 사회에서 수입차를 대하는 자세도 전보다 유연해졌다는 것이다. 지자체 소속으로 수입차를 타는 중견 공무원은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차를 출퇴근용으로 쓰지 않기도 했지만 지금은 개의치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기관장을 비롯해 상급자보다 비싼 차량을 타는 것을 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며 “이런 인식 전환도 수입차 장벽을 허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수입차를 타는 공무원을 대하는 시선이 따가운 건 현실이다. 지난해 한 지자체 환경미화원이 독일제 BMW 차량을 타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고하라”는 민원이 소속 구청에 접수된 게 사례다. 이 미화원은 투자로 수십억 원 이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구청은 미화원에게 주의 조처를 내리고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당시 해당 미화원은 구청의 조처에 대해 “자산이 많으면 해고당해야 하는가”라고 반응했다.










![[포토] 훈련장 이동하는 '시니어 아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1152t.jpg)
![[포토] 오세훈 시장과 김병주 MBK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960t.jpg)
![[포토]코스피-코스닥 동반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947t.jpg)
![[포토]SK AI 서밋 부스 살펴보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862t.jpg)
![[포토]수능 D-10](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794t.jpg)
![[포토]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세레모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583t.jpg)
![[포토]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참석한 김병환 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529t.jpg)
![[포토]검찰, 류광진 티몬 대표 소환 조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519t.jpg)
![[포토] 이동민 '우승트로피 번쩍 들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177t.jpg)
![[포토]'덕수궁의 가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295t.jpg)

![[포토]마다솜,빛나는 트로피와 금메달](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342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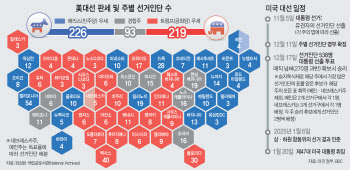
![[속보]대선 하루 앞두고…뉴욕증시 일제히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103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