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얼마 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한을 부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려는데 그걸 왜 거부하느냐는 겁니다.
|
“드문 일”, 직접감찰 거부한 대검
일단 대검은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방문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대검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라며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며 총장에 대한 감찰을 거부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드문 일”, “일반적으로”, “통상 절차” 등의 표현으로 충분히 짐작 가능하듯, 대검의 총장 감찰 거부 이유는 법률을 포함한 규정에 근거하기보다 단지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같은 충돌은 지난해 이미 예견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사태로 홍역을 치른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5조의2 (법무부 직접 감찰) 조항을 개정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등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 담보가 어려워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찰규정이 정한 감찰 대상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므로, 검찰청 공무원인 검찰총장 역시 이같은 규정에 따라 감찰 대상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
지난해 직접감찰 규정 강화… 충돌 예견
사전 소명 없이 감찰관실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대검이 주장할 여지도 있는 셈입니다.
다만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주장이 원칙적으로 틀린 것과 같은 이유로, 자신 역시 검찰 소속 검사인 검찰총장도 법무부 직접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검찰총장이 법률에 명시된 근거 없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감찰도 일반 검사와 달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확실한 것은 기존의 관행과 관성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현직 장관은 취임 후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나 발동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를 명확히 한 상태고, 총장 역시 정부 기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진 사퇴를 택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보장된 임기를 채울 것을 공언하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까닭입니다.
특정 정치진영에 대한 선호를 떠나 이번 사태의 결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토] 훈련장 이동하는 '시니어 아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1152t.jpg)
![[포토] 오세훈 시장과 김병주 MBK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960t.jpg)
![[포토]코스피-코스닥 동반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947t.jpg)
![[포토]SK AI 서밋 부스 살펴보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862t.jpg)
![[포토]수능 D-10](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794t.jpg)
![[포토]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세레모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583t.jpg)
![[포토]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참석한 김병환 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529t.jpg)
![[포토]검찰, 류광진 티몬 대표 소환 조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519t.jpg)
![[포토] 이동민 '우승트로피 번쩍 들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177t.jpg)
![[포토]'덕수궁의 가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295t.jpg)

![[포토]마다솜,빛나는 트로피와 금메달](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342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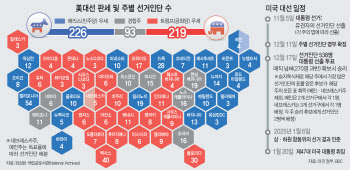
![[단독]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했지만…임금은 사실상 '삭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043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