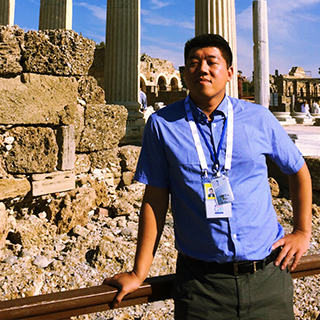산업부
이윤화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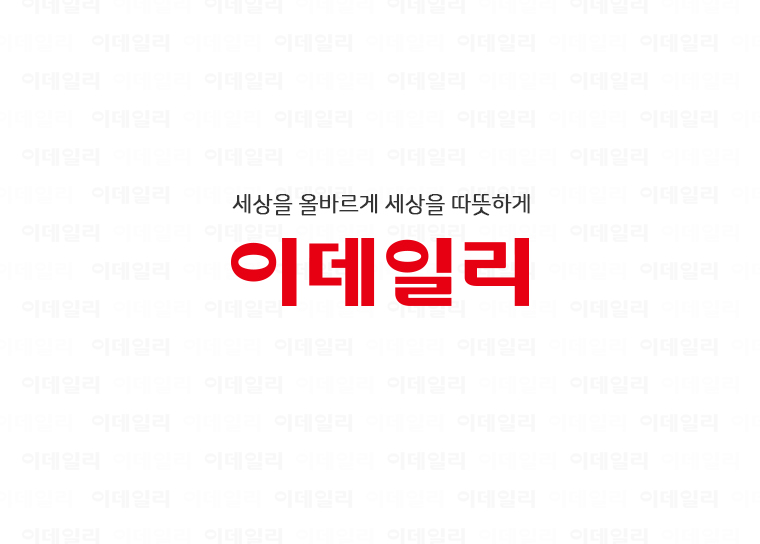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기술 '아트리아 AI', 2027년부터 양산 적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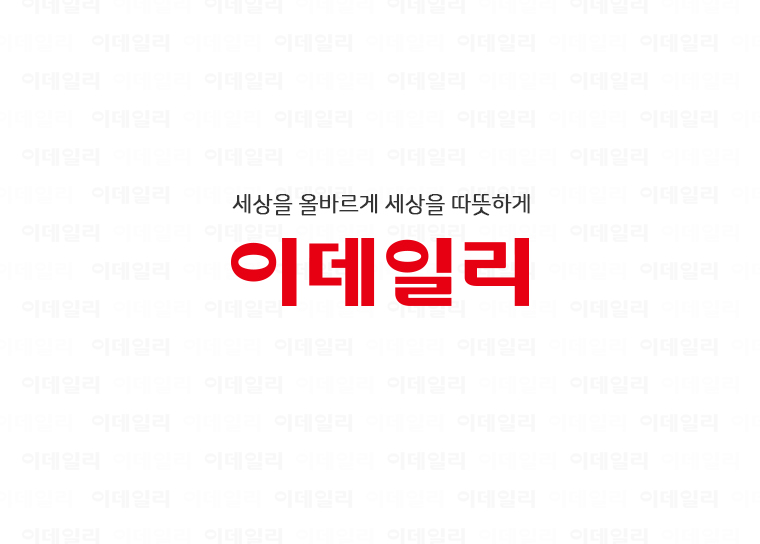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 현대차그룹, 소프트웨어 브랜드 'Pleos' 공개…"모빌리티 테크 전환"
동그라미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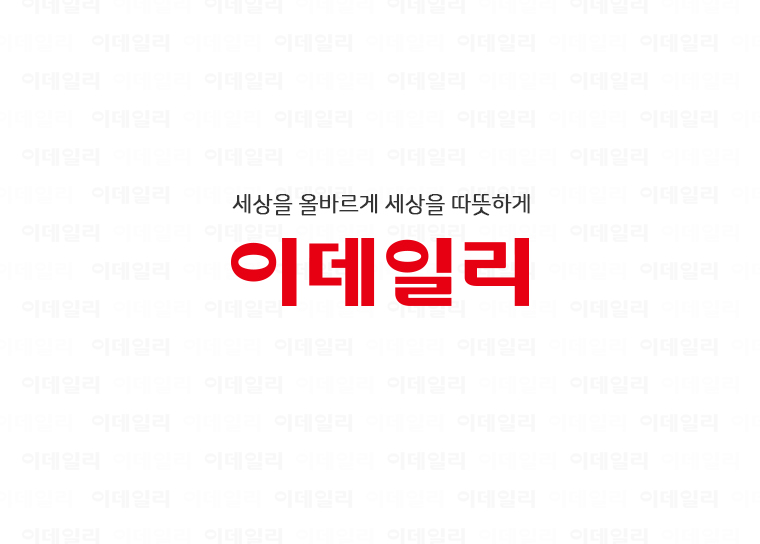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 기아의 신기술 집약체 '타스만'…"온·오프로드 모두 최적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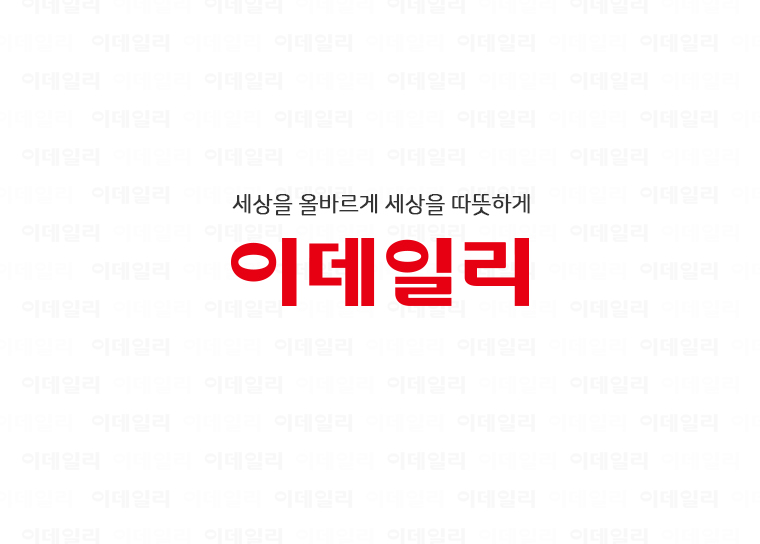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대내외 변화 대응 위한 세미나 개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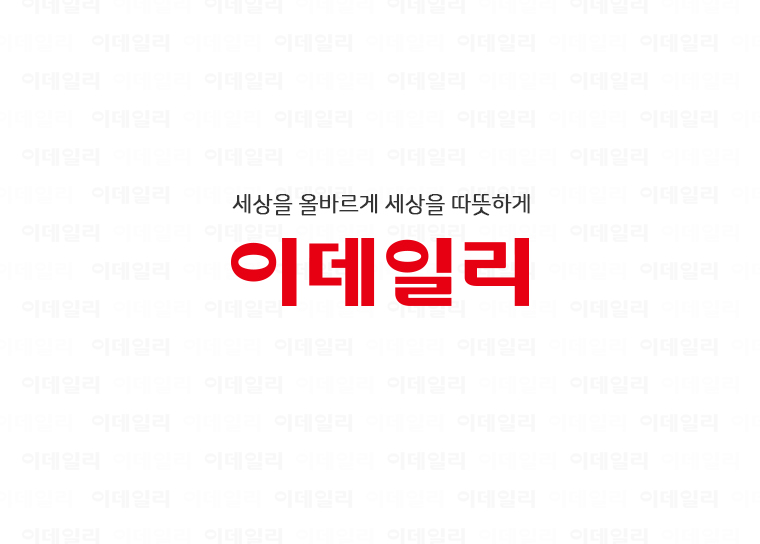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 '美관세 직격탄' 한국GM, 적자만 2조 예상…커지는 철수설
더보기
호갱NO +더보기
-
![엔진 경고등 들어와 수리 맡겼는데…또 경고등이[호갱NO]](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 엔진 경고등 들어와 수리 맡겼는데…또 경고등이
- 하상렬 기자 2025.03.29
- Q. 자동차 주행 중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자동차정비소를 찾아 수리를 맡겼습니다. 하루 뒤 차량을 인수해 주행하던 중 다시 엔진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정비소에 지급한 차량 수리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1년 11월 22일 본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B 자동차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업체는 수리비 127만원의 견적을 냈고, A씨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문제는 하루 뒤인 23일 A씨가 차량을 정비소에서 인수해 주행을 다시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2~3km 운행 중 엔진 경고등에 재차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A씨는 정비소로 돌아가 수리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정비소는 수리 직후 엔진 경고등은 꺼졌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된 것은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결국 A씨는 다른 정비소를 찾았고, C 정비소는 차량 흡기·배기 부품상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았으며, 엔진 구동축이 파손돼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A씨가 C 정비소로부터 받은 수리비 견적은 약 1850만원이었습니다.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B 정비소 때문에 본인 차량 엔진이 손상됐으므로 수리비 127만원 환급과 C 정비소로부터 받은 견적 수리비 18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B 정비소의 차량 수리 직후 엔진 경고등이 꺼졌다고 할지라도, A씨가 차량을 인도해 간 시간과 엔진 경고등 점등 시간까지 더해 고려하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라는 수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흡기밸브 클리닝과 엔진오일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차량이 정상 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소비자원은 엔진은 이물질 유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될 수 있기에 B 정비소 수리로 A씨 차량 엔진이 영구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이에 소비자원은 B 정비소가 A씨에게 수리비 127만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
![사망으로 장기렌트카 중도해지…가족이 위약금 내야할까[호갱NO]](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 사망으로 장기렌트카 중도해지…가족이 위약금 내야할까
- 하상렬 기자 2025.03.22
-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생전에 타시던 장기렌터카의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은 불가항적인 측면이 있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 장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장기렌터카 중도해지위약금을 묻는 청구서였습니다. 청구서에는 위약금 1283만 7900원과 미청구대여료 17만 1480원을 합산한 1300만 9380원이 적혀있었습니다.A씨는 업체 측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동차대여표준약관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통한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중도해지위약금이 부과된 것이고,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인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중도해지위약금 규정을 무효로 봤습니다. 소비자원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에는 임차인의 사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는 겁니다.다만 소비자원은 20%의 중도해지위약음을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될 수밖에 없는 손해의 위험을 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 역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 1283만 3790원 중 20%에 해당하는 256만 7580원으로 위약금을 제한하는 게 적정하다고 봤습니다.결국 소비자원은 위약금 256만 7580원과 미청구대여료 17만 1480원을 합산한 273만 9060원을 업체가 A씨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보증금 752만 700원을 반화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상계해 A씨에게 478만 16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
![따뜻한 날 전기장판 썼더니…집에 불이 났어요[호갱NO]](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 따뜻한 날 전기장판 썼더니…집에 불이 났어요
- 하상렬 기자 2025.03.15
- Q.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 방이 다 타버렸습니다. AS 업체 측에선 제가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치료비·화재복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A씨는 2020년 12월 B사의 전기장판을 4만 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을 구매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 폐업 상태였던 B사 대신 제품 사후관리와 배상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AS 업체 C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구체적으로 A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불이 났고,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보험처리 등을 통해 치료비, 화재복구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C사는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C사는 A씨가 제품에 동봉된 온도조절기가 아닌 별도의 제품을 사용했고,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재질의 매트리스 위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등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A씨가 잘못된 온도조절기를 사용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도조절기를 교체해 사용했다는 C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은 화재사고 당시 최저기온이 20.8℃로 전기장판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사건 당시 기온이 22.1℃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만으로 전기장판이 비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A씨가 제출한 자료에서 전기장판이 일반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A씨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C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소비자원은 화재 사고가 전기장판 하자로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C사가 배상하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제출한 자료 중 도배장판 비용인 550만원만 인정하고, C사가 A씨에게 27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