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와 엿의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박사골로 향했다. 삼계면 봉현리 숙호마을 한규체(77)·양정자(74)씨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갔다. 박사골에서 가장 엿을 잘, 그리고 오래 만들어왔다는 부부이다. 일단 박사골이란 이름의 근거부터 궁금했다. 도대체 박사가 몇이나 나왔기에? "박사골 출신으로 박사학위 딴 분이 지금까지 143명이고, 예비 박사들도 20명이 넘어요."
|
박사를 이리 배출한 것이 과연 엿 때문일까. 한규채씨는 어이없다는 듯 미소를 띄웠다. "조선 때는 삼계도 남원에 포함됐어요. 지금은 임실로 분리가 됐지만. 남원, 옛날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났소. 낙향한 양반들이 남원으로, 삼계로 찾아들었어요. 집성촌을 여기저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부터 '선비의 고장'이라 불렸습니다. 남의 집안에 뒤질세라 선의의 경쟁을 벌였소. 부모들이 자식한테 '기둥뿌리라도 팔아서 공부시킬 테니 열심히 해라'고 격려했어요. 풍수지리에 따르면 자리가 참 좋다고도 하더만. 하여간 '키포인트'는 선의의 경쟁이에요. 다들 공부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를 그리 많이 배출한 거지요."
"박사골이 '엿마을'로 소문나기 시작한 것 새마을운동 시작할 무렵"이라고 한규태씨는 기억했다. 그러니까 한 40년 전 일이다. "제가 새마을운동 지역 회장을 했어요. 당시 부녀회장이 윤순호씨란 분이여. 그분 엿이 남들하고 달랐어요. 과거 엿 만드는 방법이 아니야. 사글사글하니 참 좋아. 그래서 우리 안사람한테 가서 엿 만드는 법을 배워오라고 했어요. 이런 자랑 하면 안 되지만(지방 어른들은 늘 이렇게 아내 자랑을 시작한다), 안사람이 음식을 참 잘해요. 그때 윤순호 부녀회장한테 배워온 엿 만드는 기술이 퍼진 것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버렸소."
한씨는 박사골 엿의 가장 큰 특징을 물으니 "사글사글하다"고 했다. 딱딱하지 않고 이에 들러붙지 않아서 먹기 편하고 맛있다는 뜻이다. 양정자씨에게 어떻게 만드느냐고 물었더니 "설명해주면 아느냐"며 웃는다. "쌀을 물에 담가. 오늘 담그면 내일 시루 걸고 쪄. 물을 데워 갖고 엿기름 풀어 가지고 고두밥 헌 놈을 퍼부어. 휘휘 저어 갖고 양쪽에서 잡아당겨. 6명이 한 조로 일해요. 둘이 갱엿(엿기름 푼 물에 밥을 넣어 삭히면 만들어지는, 누런 시럽 같은 엿)을 떼어서 초벌해 줘. 그러면 둘이 받아서 잡아 댕겨. 바깥에서 한 양반이 잡아당기고, 한 양반이 끊고. 농도를 알맞게 잘 맞춰야 돼. 일기(日氣)를 매일 들어야 해. 날씨에 맞춰서 되게 푸고 묽게 푸고 하지."
|
상자를 열어보니 엿이 상자에서 흘러내릴 것처럼 수북하게 담겨 있다. 한씨는 "무조건 푸짐하게 기분 좋게 담는다"고 했다. 취재를 마치고 떠나는 기자에게 "올라가면서 먹으라"며 '엿 손잡이'를 비닐봉지 하나 가득 담아 쥐여줬다. 박사가 넉넉한 인심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 잠깐 생각했다.
▶ 관련기사 ◀
☞섬진강에서 시(詩)는 잊어라 강(江)이 그냥 시(詩)가 된다
☞뮤지컬쇼·클럽파티·코스요리 ‘성탄절 24시간도 모자란다’
☞겨울에 가보고 싶다… 안갯속 고요한 종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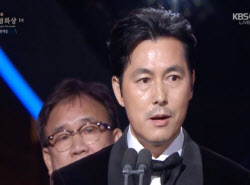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강 건너고 짐도 나르고…‘다재다능’ 이상이의 무한변신 차는[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3000161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