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6일 가계부채 관리 7대 해법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으며 그 해결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 대비 15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안이 주목 받는다. 이른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늦추겠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증가는 ‘관리’될 수 있는 것일까.
|
가계부채 어디까지 왔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가 빌린 돈은 1344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갈아치웠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빚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대출 받아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는 건 성장의 주요 조건이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급증하는 빚을 감내하기도 점차 버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2.1%로 80%를 처음으로 웃돌았다.
과도한 부채는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원리금을 갚는 데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전체 70%에 달했고 이 가운데 4분의3은 이미 소비 지출과 저축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나 취약차주 등 취약계층은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빚 갚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총량 관리 대책 먹힐까
문재인 후보가 내건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의 관건은 실행 가능 여부다. 가계만 따졌을 때만 해도 이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가계신용 기준 153.6%로 150%를 웃돌기 시작했다.
국가 간 비교할 때 쓰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소규모 개인 사업자나 비영리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이 비율은 178.9%(자금순환 통계 기준)로 더 높아진다. 이대로라면 가계부채 절대 수준 자체를 줄이거나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지표를 봐도 소득은 의미 있는 수준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지난해 3.5%(전년비)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1976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3.2%), 금융위기 때인 2009년(3.3%) 정도와 비교해서만 더 높았다.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득이 늘어나기 쉽지 않다는 게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결국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기관 역시 여신 절반 가까이를 가계부문으로 운용하는 상황에서 급격히 가계대출을 옥죄면 수익성·건전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부채 감축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가뜩이나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데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였을 때 충격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소득 증가를 가계부채 해결책의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미 정부와 감독당국이 실시한 대책은 부작용이 가시화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으로 은행권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지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 2015년 8.3%였던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13.8%로 치솟는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8.5%에서 9.5%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은 “한도가 정해져있다면 금융기관은 당연히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대출해줄 것이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부채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묶겠다는 건 너무 단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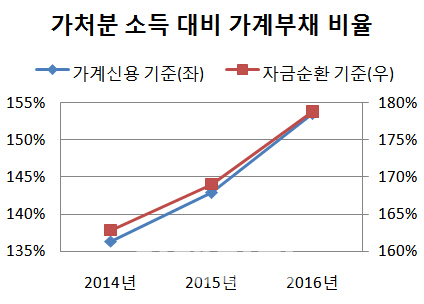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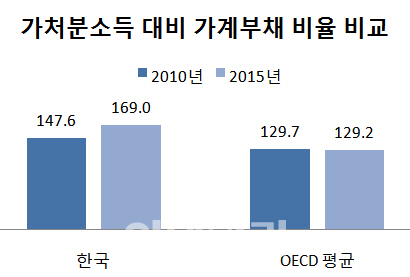








![[포토]12월 LPG 국내 프로판 가격 인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32t.jpg)
![[포토]초코과자 가격 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24t.jpg)
![[포토]점등 앞둔 사랑의 온도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12t.jpg)
![[포토]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294t.jpg)
![[포토]짙은 안개에 갇힌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227t.jpg)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11월 물가상승률 1.7% 전망"…환율 상승에 '수입물가'는 부담[물가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0015h.jpg)
![강풍에 체감온도 '뚝'…추위 속 흐리고 비[오늘날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0006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