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설치미술가 최정화가 수원 아트스페이스 광교 개관전 ‘잡화’에 내놓은 ‘타타타’(2019). 누군가 쓰다 버린 철제 그릇과 주전자, 냄비 등을 배배 꼬아 만들었다. 쓸모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의 연결과 대립, 무한순환이란 의미를 담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수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쓸데없는 것이 한 데 뒤섞인 것, 또는 그 물건.” 세상은 ‘잡동사니’를 이렇게 부른다. 여기저기에 널브러진 온갖 잡것, 골동이란 뜻이다. 방향을 조금 틀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물품.” 그래, ‘잡화’다. 그다지 쓸데없진 않은, 그래서 어디에선가 한 번쯤은 쓰임새가 있을 법한. 그런데 말이다. 잡동사니든 잡화든 딱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눈물겹도록 생활밀착형이란 점이 아니겠나. 쓰다가 쓰다가 멀리 던져놔도 전혀 아깝지 않은, 어차피 ‘예술’과는 거리가 한참 먼 그것.
그런데 여기 뭔가 좀 이상하다. 세상의 모든 ‘아깝지 않은 생활밀착형 물건’들이 모여 저마다 ‘예술’을 외치고 있으니. 크고 작은 초록색 소쿠리부터 한눈에 봐도 오래된 조명기구, 구겨진 페트병과 그 뚜껑, 녹슨 철판과 절름발이 나무의자, 플라스틱 빗과 빗자루 또 파리채, 찌그러지고 칠이 다 벗겨진 갖은 냄비까지.
자, 일찌감치 ‘까고’ 시작하자. 이곳은 경기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최근 문을 연 수원컨벤션센터 내 아트스페이스 광교다. 그 1872㎡(약 566평) 규모 중 실내 지하전시장(약 300평)을 이들 잡다한 물건이 입추의 여지없이 빽빽하게 채우고 있다는 얘기다. 일상의 참 보잘것없는 소재를 예술의 장면으로 끌어내 승화시킨 현장. 아마 누군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테다. 맞다. 여기는 설치미술가 최정화(58)가 또 다시 ‘한 판’을 벌인 곳이다. 수원시미술관사업소가 연 아트스페이스 광교 개관전 ‘잡화’다.
 | | 최정화의 ‘오뚜기 알케미’(2019). 작가 최정화를 만든 그 발단이라 할 초록색 ‘소쿠리’를 쌓아 푸른 숲으로 형상화했다. 이른바 생활용기탑이다. 누군가 툭 치고 지나가면 다양한 사운드가 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흔들 움직이기 시작한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소쿠리의 반란, 빗자루의 혁신
전시에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아니 그 이상의 잡동사니가 총출동했다. 그나마 명찰을 달고 나온 작품만 100여점. 미처 이름을 챙기지 못한 물건, 또 한 작품에 든 수많은 가짓수를 포함하면 족히 수백 점은 넘어 보인다. 한 줄로 세우고, 길게 엮고, 뭉텅이로 엉켜 올리고. 이들을 진두지휘한 최 작가는 이 분야에서 일찌감치 ‘세계적’이란 타이틀을 거머쥔 이다.
현대사회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기까지 하는 사물을 변신시키자, 그 시작은 1990년즈음이었단다. 플라스틱 소쿠리를 쌓아 만든 설치물부터였다. 어지럽고 너저분할 듯한 그 물건은 작가 특유의 조형감각으로 아름답게 ‘환골탈태’했다. ‘일상의 예술화’를 넘어 ‘예술의 일상화’를 코드명 삼아 30여년을 이어온 작업의 발단이었다. “최정화다운 ‘짓’과 ‘것’을 펼치는 축제의 장”은 이후론 더욱 거침이 없었다. 가히 역모급이었다. 소쿠리의 반란, 냄비의 반역, 빗자루의 혁신을 꾀하는.
2005년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옥상에는 한국선 거들떠도 보지도 않은 붉은색 소쿠리를 올려 거대한 성벽을 쌓기도 했고(‘욕망장성’). 2008년에는 잠실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외벽에, 2009년에는 옛 기무사 건물(지금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옥상에 플라스틱 잡동사니를 탑처럼 ‘구축’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2018’로 소개한 작품으론 정점을 찍었다. 낡은 가정용 식기를 집합시켜 9m 3.8t의 거대한 꽃을 피워냈으니(‘민들레’·2018).
 | | 설치미술가 최정화가 세상의 잡동사니를 동원한 자신의 작품 앞에 섰다. 다듬이돌, 촛대, 플라스틱 솔로 만든 꽃장식까지. 뒤로 ‘바를 정이기 어려운 바를 정’이란 작품이 보인다. “그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서 사물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했을 뿐, 내 작품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왜 굳이? 세상에 많고 많은 소재 중 작가는 왜 굳이 이 하찮은 것들에 눈과 손을 돌린 건가. 아마 “창조는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란 그의 철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상의 삶에 모세혈관처럼 퍼져 스민 것이 창조니, 누구라도 관여하고 또 개입해야 하는 영역이란 얘기다. 그이의 작품은 그 철학 위에 그저 그렇게 쓰이고 버려지는 잡스러운 물건에 특별한 애정을 듬뿍 얹어냈다는 것이고. 한 가지가 더 있다. 세상의 물건은 ‘내 것이되 내 것일 수만은 없다’는 공유경제 개념. 이번 전시 대표작인 ‘빛의 묵시록’(2019)을 두고 최 작가는 그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빛을 모아 만든 작품”이라고. 그도 그럴 것이 시민 참여 공공미술프로젝트 ‘모이자 모으자’를 통해 기증받은 스탠드·조명 300여점으로 꾸며낸 것이니.
 | | 최정화의 ‘빛의 묵시록’(2019). 시민 참여 공공미술프로젝트 ‘모이자 모으자’를 통해 기증받은 스탠드·조명 300여점으로 꾸며낸 작품이다. ‘나의 빛이 너의 빛을 만나 우리의 빛이 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빛으로 태고의 풍경과 미래의 풍경을 연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예술은 삶과 치밀하게 맞닿아 있어야”
‘잡화’란 게 그렇지 않은가. 어차피 누구 한 사람의 소유일 순 없다. 쓰다 버린 철제 그릇과 주전자, 냄비 등을 배배 꼬아 만든 ‘타타타’(2019)가 그렇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순환의 ‘뫼비우스의 띠’란 의미가 괜히 따라붙은 게 아니다. 예의 그 초록색 소쿠리를 탑으로 형상화한 ‘오뚜기 알케미’(2019), 각이 제대로 잡힌 빨갛고 파란 바구니를 피라미드처럼 세운 ‘나의 아름다운 21세기’(2019)도 마찬가지다. 소쿠리든 바구니든 평생 한두 개 쓰는 게 고작일 터. 검붉은 녹까지 내려앉았지만 우주의 진리를 띄운 둥근 수레바퀴 모양은 포기하지 않은 ‘삭은 페트병 만다라’(2019)는 또 어떤가. 결국 이 모두는 우리 삶과 치밀하게 맞닿아 있는 예술이고 미술이란 뜻을 품었다.
 | | 최정화의 ‘삭은 페트병 만다라’(2019). 페트병에 내려앉은 검붉은 녹이 인상적이다. 녹슬고 삭이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완성한 우주의 원만한 진리, 둥근 수레바퀴 모양은 포기하지 않은, 만다라를 상징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당연히 관건은 조화와 화합이다. 움직임과 고요함의 변화, 상반된 것들의 공존, 부조화의 통일 등이 뿜어내는 생명력을 끄집어내는 일. 여기에 최 작가는 소소한 물건에 대한 찬사만도 아닌 자본만능에 대한 비판만도 아닌 중간관리자 역할까지 기꺼이 담당한다. 이런 식이다. 미세먼지를 첩첩이 겹쳐 놓으면 종유석 정도는 우스울 거고(‘미세먼지기념비’·2019), 동글동글한 구슬도 모아두면 이처럼 눈이 부시게 반짝일 순 없을 것이며(‘눈부시게 하찮은’·2019), 어느 대형미용실이 이보다 더 알록달록하고 다채로운 빗을 구비했다고 할 건가(빗, 움, 빛·2019).
 | | 최정화의 ‘미세먼지기념비’(2019·왼쪽). 미세먼지를 첩첩이 겹쳐 놓으면 종유석 정도는 우스울 거란 비아냥이 들어 있다. 가운데에 ‘눈부시게 하찮은’(2019)이 보인다. 반짝이는 미러볼 탑 12개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키네틱 설치작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머릿속을 한바탕 뒤집어놓은 ‘정신 사나운’ 전시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작가의 메시지는 직설적이고 단순하다. “존재는 서로 만나게 돼 있고, 모든 것은 빛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난장판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닌가. “사물이 먼저 말을 걸었고 난 귀를 기울였을 뿐,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서 만나게 해줘야겠다 했을 뿐”이라고. ‘최첨단 민속박물관’ 같은 전시장을 빙빙 돌며 어떤 고물을 건져내든 그것은 분명 ‘빛’이다. 전시는 8월25일까지.
 | | 최정화의 ‘달팽이와 청개구리’(2019). 빠른 성장과 경쟁시대에 필요한 느림의 미학을 거대한 달팽이와 그 위에 올라앉은 청개구리로 표현했다. ‘달팽이와 청개구리’를 비롯해 ‘잡화’ 전은 수원 아트스페이스 광교를 둘러싼 대형 야외작품 ‘러브 미’(2019), ‘과일나무’(2005), ‘무의열반’(2016) 등을 전시하고 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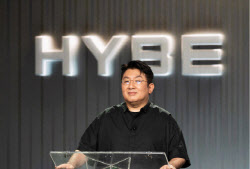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포토]이틀 연속 폭설에 눈 쌓인 북한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096t.jpg)
![[포토]서울리빙디자인페어 in 마곡](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081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