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카드수수료)을 정부가 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우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일부 완화해 가맹점주가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사진=이미지투데이) |
|
카드수수료는 법에 따라 정부가 정하는 유일한 시장 가격이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원가인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중소 및 영세가맹점 범위와 이들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를 조정한다. 그간 우대수수료는 낮아지고 적용 대상은 확대됐지만, 정부가 새로운 수수료를 발표할 때마다 카드사와 자영업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한 결과라며 이젠 ‘카드수수료 정상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시장 특성상 당장 우대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자영업자가 카드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가맹점이 일정 금액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용하는 게 카드수수료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19조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선 안 된다. 가격을 깎는 대신 현금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다.
그러나 이 조항이 카드사의 시장지배력을 키우고 가맹점의 카드사 대비 가격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게 서 교수의 분석이다.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데,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탓에 가격 협상력의 지위가 카드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호주에선 카드 결제에 대해 부가 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제도 초기엔 부작용이 있었지만 부가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고 시장 컨세서스가 이뤄진 이후엔 가맹점에 협상력이 생겨 오히려 카드수수료가 시장 자율적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5만원 정도까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를 완화하면 카드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이 상당 부분 사그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세금 확보를 위해 의무수납제를 고수하려 하겠지만, 시장 원리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적격비용 산정 체계가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교수는 “현재는 과거 자금조달 비용을 산술 평균해 적격비용을 산정하는데 지금처럼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땐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에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장금리가 낮아질 땐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자금조달 비용이 급격히 오를 땐 수수료율을 올려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적격비용 체계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져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카드사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카드수수료인 반면 미국은 연회비가 전체 수익의 70%에 달한다”며 “연회비가 높은 대신 카드로 결제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코스트코 모델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서 수수료가 낮아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론 등 부가 수익원을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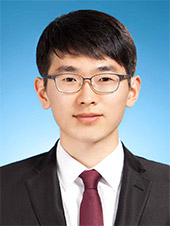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포토]이틀 연속 폭설에 눈 쌓인 북한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096t.jpg)


![“신장 면화 안산다고? 유니클로 불매” 들끓는 中 민심[중국나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901024b.jpg)

